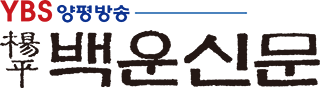천상의 화원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두물머리 새벽 풍경을 본 동생의 성화 때문에 결국 새벽강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새벽 다섯시 날카롭게 벨이 울린다. 어떤 이유든 일요일 아침잠을 빼앗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이다. 이불을 더욱 깊게 뒤집어쓰고 잠을 청하나 마음이 편치 않다. 벌써 몇 번의 공수표. 결국 일곱 시 푸른빛이 남아 있을 하늘과 맞닿은 호수 두물머리로 향했다. 이미 한여름의 쨍쨍한 햇살을 받은 두물머리는 푸른 빛이 전부 가신 뒤였다. 두물머리 산책로 옆 논에 비뚤비뚤 심어 놓은 모가 벌써 짙은 녹색을 자랑하며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팔십 년 대 초반 대학을 함께 다닌 우리 자매는 많은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밤새워 읽었던 제3세대 문학전집, 20킬로그램이 넘는 배낭을 메고 영남 알프스 능선을 종주하며 산 정상 텐트 안에서 바라본 별들. 삼십대 전까지의 소소한 모든 추억의 장면에는 언제나 동생이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두물머리를 떠나 서종면 통방산으로 행했다. 통방산은 양평군 서종면과 가평군 설악면의 경계에 위치한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산이다. 노문리로 들어와 일주암을 거쳐 통방산에 오르니 명달의 경지에 도달하더라. 펄펄 끓는 화로 속에 드니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노문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일주암), 하늘이 열리는 곳에 있으니(통방산), 사물의 이치가 밝힐 수 있다(명달리). 통방산에 둥지를 튼 통방산주 정곡사 스님의 이곳 통방산 명달리에 대한 해석이다. 중미산과 화야산을 좌우로 거느리고 용문산과 운길산이 손에 잡힐 듯한 중심에 위치한 통방산으로 향하는 길은 천상의 화원으로 들어가는 여행의 출발점이다. 이십대 초반 미친 듯이 산을 탐했던 시절,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능사로 알고 땅만 보고 도착점만을 향해서 그저 앞으로만 돌진했었다. 나무도 꽃도 하늘도 구름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머리 속에는 온통 정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젊음만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살아온 치기 어린 시간들이었다. 정상에 서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을 열고 진정 자연을, 산을 받아들여 본 적이 별반 없는 것 같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산이, 정상을 밟은 산이 하나 늘었을 뿐이었다. 내 속도를 제어하며 영남 알프스 능선의 용담꽃 군락지며 설악산 서북능선의 금강초록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것은 언제나 동생이었다. 이젠 들에서 산에서 들꽃을 만나면 꼭 이름을 불러본다. “큰꽃으아리야. 무당벌레에게 좋은 집을 제공했구나. 나보다 마음 씀이 훨씬 낫구나.” “어이! 초롱꽃 어젯밤에는 뉘 집의 대문을 밝혔는고.” “두루미꽃, 저번에는 네 이름을 잘못 불렀구나. 정말 미안해.” 천상의 화원에서 만난 들꽃들을 소개합니다. 팔십년 대 초반 이 꽃의 아름다운 자태에 푹 빠진 김일성의 교시로 진달래를 물리치고 북한의 국화로 등극한 함박꽃나무입니다. 북한의 국화였던 진달래 비슷한 것만 그려도 치도곤을 당했던 이쪽이나 최고 지도자의 말 한 마디로 국화가 바뀌는 저쪽이나 분명 정상의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꽃을 그냥 꽃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을 옥죄는 도구로 이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함박꽃나무는 알고 있을까요? 가만히 꽃을 들여다보면 초롱꽃이란 이름이 바로 연상됩니다. 골짜기 가득 청사초롱 밝혀 온 산을 환하게 바꿨습니다. 참꽃으아리 홀씨 속에 집을 지은 무당벌레는 참 좋겠다. 황토로 지은 정곡스님의 오두막도 통천, 신통이의(정곡사의 견공들) 통나무집도 부러웠지만 가장 날 부럽게 한 것은 무당벌레의 참꽃으아리 속 집입니다. 노루발과 천마입니다. 노루발의 이름을 바로 불렀는데, 천마는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어 전문가인 정민호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마철 전후로 축축한 그늘 숲에 잽싸게 꽃대가 올라 왔다가 금방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상태좋은 걸 보기가 쉽지 않던데 아직 피기 전의 생생한 걸 포착하셨네요.” 아침부터 칭찬을 받아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벌레들도 좋아하나 봅니다. 성한 잎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래 잎이 온통 벌레자국입니다. 80년대 후반 키위를 처음 먹어봤을 때의 익숙한 기억. 다래맛이었습니다. 양다래인 키위와 맛이 거의 똑같습니다. 온 산을 흰 빛으로 물들인 큰까치수염과 키다리난초랍니다. 연두색의 꽃을 가진 어제 처음 만나 안면을 튼 녀석입니다. 숲 속에는 정말 갖가지의 상상을 초월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길가 풀 숲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생명력 왕성한 가시엉겅퀴입니다. 오묘한 꽃분홍의 꽃과 왕성한 번식력을 가졌는데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길을 내 주다 보니 요즘은 귀한 꽃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홀씨를 만들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둥글레와 돋나물은 한살이를 접고 산수국과 나리꽃은 한살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살이도 꽃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게 남은 것은 분명합니다. 큰꽃으아리와 무당벌레의 공존을 배워야겠습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